랩터를 타고 가다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중의 하나가 바로 위의 제목에 쓴 말이다.
이밖에도 "허리 졸라 아프겠당~", "왜 그런거 타요?", "장거리는 못가겠네~"등등... 일일히 답변하기도 뭐하고, 무시하기도 애매한 질문이자 감상인데, 이럴때 좋은 말이 바로 군대에서 많이 듣는 "몸을 옷에 맞춰라!"라는 말이다.
군에서 보급품으로 옷을 지급받으면 종종 자신의 사이즈와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땐 정말 몸을 옷에 맞추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다.
커스텀 바이크는 그 특성상 라이더의 편안함과 안락한 자세보다는 메카니컬한 부분과 미학적인 부분이 우선시되는 분야다.
주문제작일 경우 애초 주인의 체형과 취향이 반영되긴 하지만 역시 시판차량과는 승차감의 차이가 크다.
일단 랩터와 비슷한 컨셉과 비슷한 라이딩 포지션을 갖는 다른 바이크 두종을 비교해보자.
 가운데는 일본 제로 쵸퍼스의 바이크로 랩터와 마찬가지로 리지드 프레임에 프론트 풋레스트, 낮은 핸들바가 특징인데, 프레임과 시트, 풋 레스트 포지션은 랩터와 거의 같지만 핸들바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약간 높다.
가운데는 일본 제로 쵸퍼스의 바이크로 랩터와 마찬가지로 리지드 프레임에 프론트 풋레스트, 낮은 핸들바가 특징인데, 프레임과 시트, 풋 레스트 포지션은 랩터와 거의 같지만 핸들바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약간 높다.
아래의 백신스키는 랩터와 마찬가지로 맷블랙 바이크로, 할리를 베이스로 만들어져 뒷쪽에 쇽 업 쇼버가 숨겨져 있다.
풋 포지션은 랩터보다 좀더 앞으로, 핸들바는 드래그바를 사용해서 약간 높은 편이다.(물론 일반적인 다른 어메리칸 스타일 바이크들 보다는 낮지만)
랩터는 제작 당시부터 아주 익스트림한 컨셉으로 제작된 바이크다.
강철을 사용해 만들고 그 용접자국을 그대로 살리며 녹이 슬던 말던 색칠조차 안한, 그리고 딱딱한 고정 차체에 강철로 만들어져 쿠션이 거의 없는 시트, 극악의 라이딩 포지션... 사실 어찌보면 고문도구나 다름없는 이 바이크에 일단 '몸을 맞추면' 다른 바이크는 심심하고 재미없어서 탈 맛이 안난다.
"세상엔 편한게 다가 아닐때도 많다."
이밖에도 "허리 졸라 아프겠당~", "왜 그런거 타요?", "장거리는 못가겠네~"등등... 일일히 답변하기도 뭐하고, 무시하기도 애매한 질문이자 감상인데, 이럴때 좋은 말이 바로 군대에서 많이 듣는 "몸을 옷에 맞춰라!"라는 말이다.
군에서 보급품으로 옷을 지급받으면 종종 자신의 사이즈와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땐 정말 몸을 옷에 맞추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다.
커스텀 바이크는 그 특성상 라이더의 편안함과 안락한 자세보다는 메카니컬한 부분과 미학적인 부분이 우선시되는 분야다.
주문제작일 경우 애초 주인의 체형과 취향이 반영되긴 하지만 역시 시판차량과는 승차감의 차이가 크다.
일단 랩터와 비슷한 컨셉과 비슷한 라이딩 포지션을 갖는 다른 바이크 두종을 비교해보자.

아래의 백신스키는 랩터와 마찬가지로 맷블랙 바이크로, 할리를 베이스로 만들어져 뒷쪽에 쇽 업 쇼버가 숨겨져 있다.
풋 포지션은 랩터보다 좀더 앞으로, 핸들바는 드래그바를 사용해서 약간 높은 편이다.(물론 일반적인 다른 어메리칸 스타일 바이크들 보다는 낮지만)
랩터는 제작 당시부터 아주 익스트림한 컨셉으로 제작된 바이크다.
강철을 사용해 만들고 그 용접자국을 그대로 살리며 녹이 슬던 말던 색칠조차 안한, 그리고 딱딱한 고정 차체에 강철로 만들어져 쿠션이 거의 없는 시트, 극악의 라이딩 포지션... 사실 어찌보면 고문도구나 다름없는 이 바이크에 일단 '몸을 맞추면' 다른 바이크는 심심하고 재미없어서 탈 맛이 안난다.
"세상엔 편한게 다가 아닐때도 많다."
바이크를 탈때 필요한 것은 거의 없다.
다른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많이도 챙기는 모양이지만 나는 그저 고글과 장갑, 헬멧 하나면 충분하다.
내 머리에 꼭 맞는 헬멧은 마치 내 바이크 만큼이나 또다른 나처럼 느껴진다.

아산만으로 가는 도중에 들린 휴게소에서 커피한잔 마시고 있으니 우리 일행외에도 수많은 바이크들이 몰려 들어온다.
사진에 나오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아마 족히 백여대에 가까운 바이크들을 본 것 같다.

황사와 황해바다...
누런 갯벌과 누런 하늘, 그리고 석양이 질때면 붉게 변하는 서해바다는 푸른 동해와는 또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
아산만에서 만난 주한 외국인 라이더들.
인근의 평택에서 온 팀으로 주로 주한미군이거나 미군에서 일하는 군속들이라고 한다.
왼쪽의 검은 자켓 입은 아저씨는 미국에서 쵸퍼를 탔던 사람이어서 내 바이크를 보자마자 뒷쪽 쇽업쇼버가 없는 리지드 스타일을 타는게 멋지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린다.

다른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많이도 챙기는 모양이지만 나는 그저 고글과 장갑, 헬멧 하나면 충분하다.
내 머리에 꼭 맞는 헬멧은 마치 내 바이크 만큼이나 또다른 나처럼 느껴진다.

아산만으로 가는 도중에 들린 휴게소에서 커피한잔 마시고 있으니 우리 일행외에도 수많은 바이크들이 몰려 들어온다.
사진에 나오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아마 족히 백여대에 가까운 바이크들을 본 것 같다.

황사와 황해바다...
누런 갯벌과 누런 하늘, 그리고 석양이 질때면 붉게 변하는 서해바다는 푸른 동해와는 또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

아산만에서 만난 주한 외국인 라이더들.
인근의 평택에서 온 팀으로 주로 주한미군이거나 미군에서 일하는 군속들이라고 한다.
왼쪽의 검은 자켓 입은 아저씨는 미국에서 쵸퍼를 탔던 사람이어서 내 바이크를 보자마자 뒷쪽 쇽업쇼버가 없는 리지드 스타일을 타는게 멋지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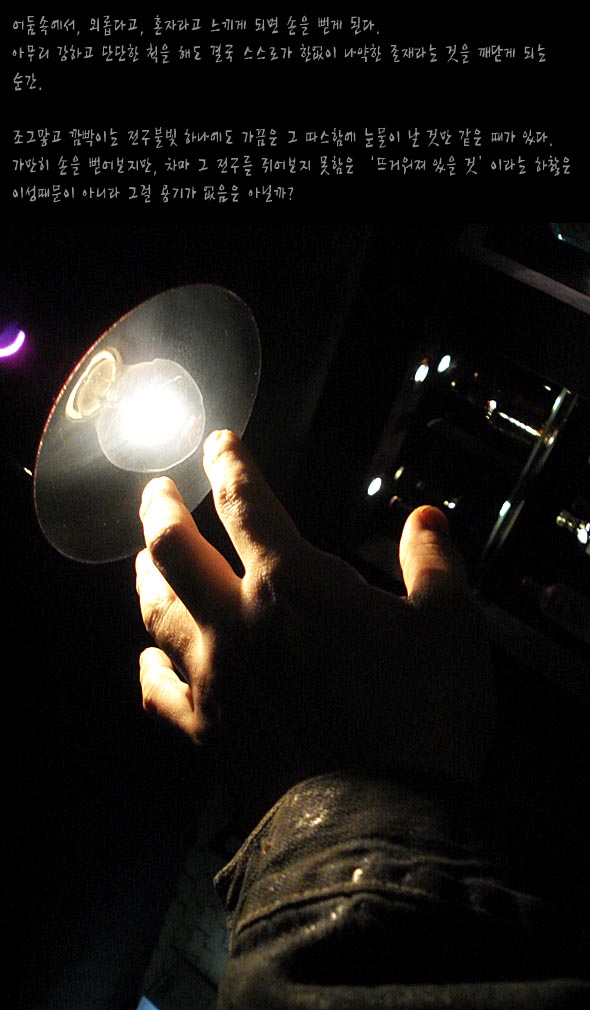
 PREV
PREV